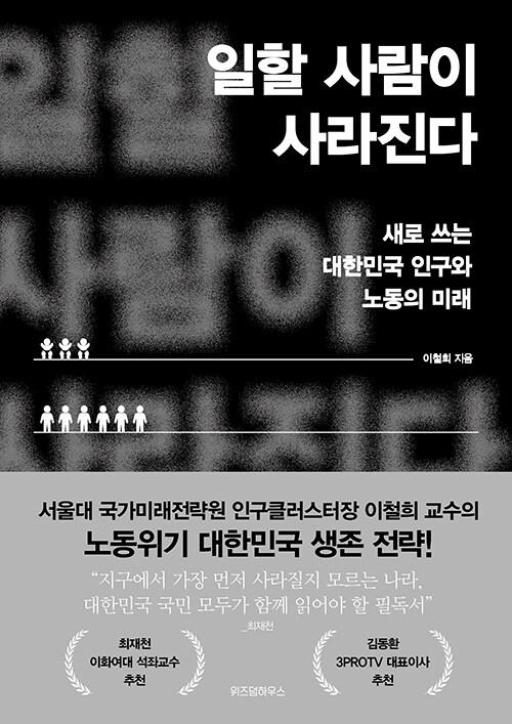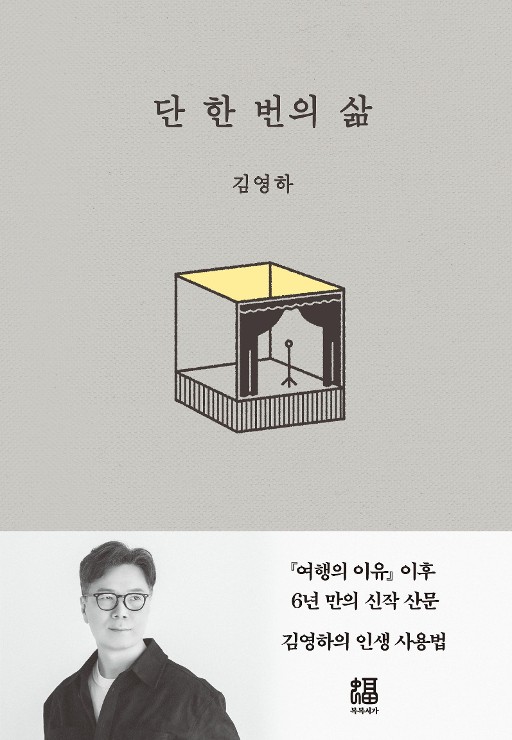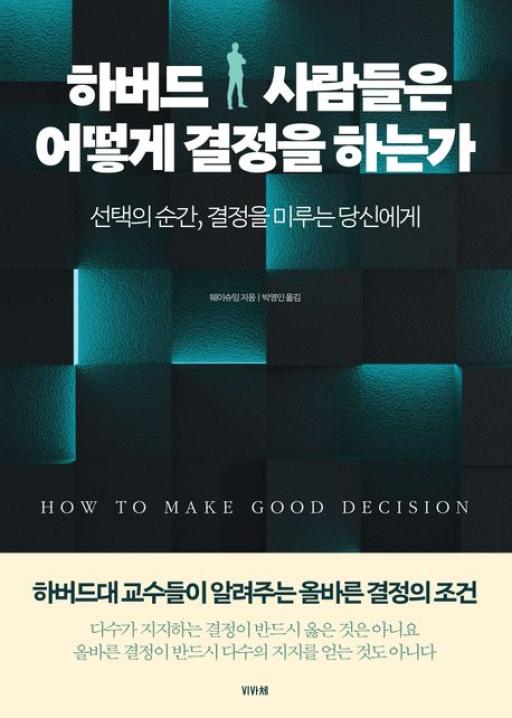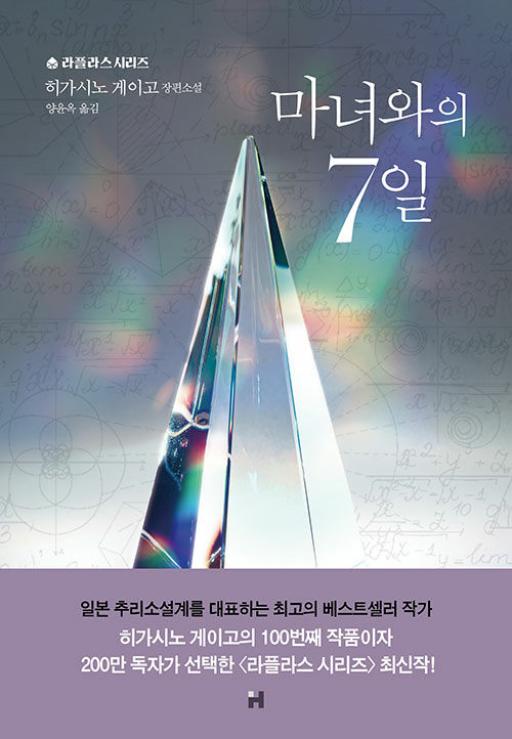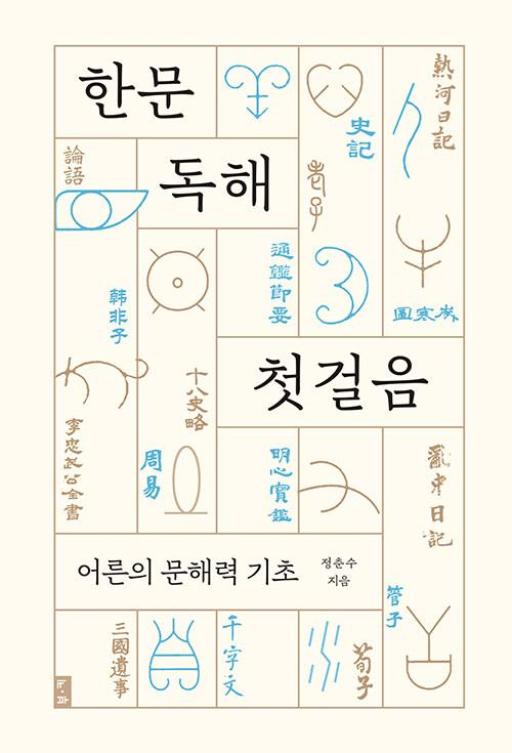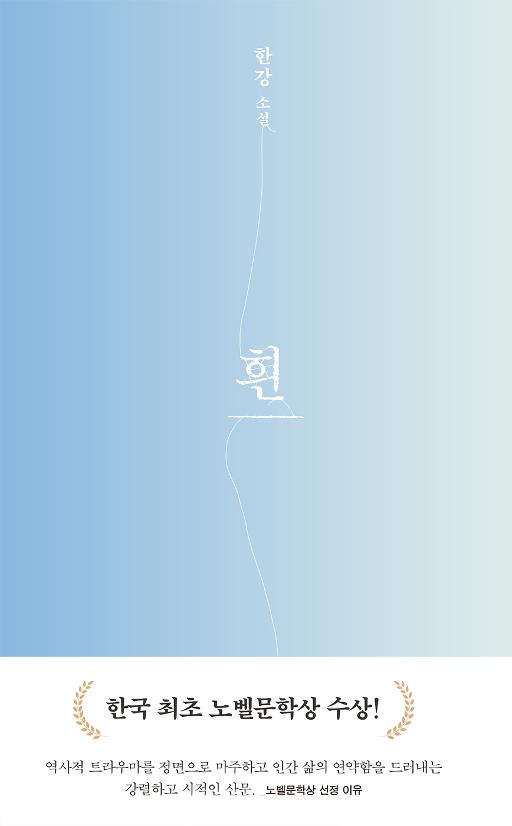2025-06-20
문병삼
흰
0
0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후 세번째 읽은 한강 작가의 글이다. 작가는 흰을 이렇게 말한다. 흰색을 말할때 하얀과 흰이라는 말이 있는데 솜사탕처럼 깨끗한 하얀이라는 말과 달리 흰에는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 있다고.. 책은 "강보, 배내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련, 흰 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 개, 백발, 수의"라는 제목으로 단편 글을 쓰고 있다. 작가는 소년이 온다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이 글을 시작했다. 폴란드는 1944년 구월 시민 봉기 이후 히틀러가 본부기로 절멸을 지시했던 도시로 폭격에 의해 95%이상의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부서진 흰 석조건물들의 잿빛 잔해로 그곳이 흰 도시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같이 흰 도시에서 쓴 흰 것들은 모두 우울하고 암울하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모두가 밝음보다는 어둠, 희망보다는 절망이 스려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절망도 아니다. 작가의 흰에 대한 정의처럼 삶과 죽음이 모두 배어있다. 이 책의 시작은 "강보, 배내옷"이다. 이 단편은 작가의 어머니가 스물네살때 낳은 첫 아이가 숨을 거두기 두시간동안의 감정을 소스란히 드러낸 글이다. 아기가 나오기 전 엄마가 만든 배내옷과 강보로 쓸 홑이불을, 아이가 죽은 후 아버지는 아이의 배내옷을 수의로, 강보를 관으로 산에 묻었다.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의 비통함이 절절하다. 나또한 눈물이 난다. 작가의 내면적 어둠과 달리 표현은 너무 현실적이고 아름답다. 모든 글들의 표현이 아름답지만, 특히 아랫니 단편의 "언니, 라고 부르는 발음은 아기들의 아랫니를 닮았다"라는 표현이 더욱 아름답다. 죽지 않았으면 작가의 언니가 되었을 아기를 연상할 수 있는 언니, "내 아이의 연한 잇몸에서 돋아나던, 첫 잎 같은 두 개의 조그만 이"라는 표현을 보고 한 참이나 눈을 때지 못했다. 작별이라는 단편에서는 "죽지마, 죽지마라, 제발"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소년이 온다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다. 죽음과 삶이 배어 있는 작가의 마음을 느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