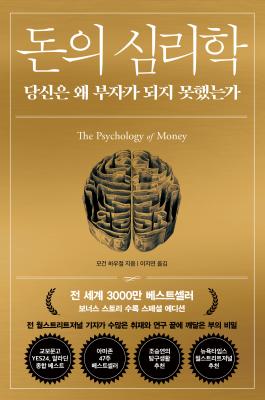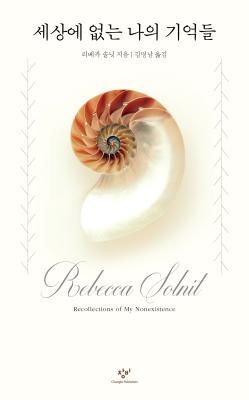2022-05-31
최민지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
0
0
페미니즘을 접하며 리베카 솔닛에 대해 자주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간 수많은 페미니즘 서적을 읽어왔으나 단한번도 리베카 솔닛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쓴 주옥 같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사랑받은(책에 종종 한국을 언급함) 작품들이 많으나 이왕 그의 신작으로 첫만남을 가지고 싶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글쓰기를 통해 자아를 다지고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으로 단단히 이름을 알려온 분이라 그런지 글 한편한편이 촘촘하고 유려했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요즘처럼 단편의 글로 강력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편의 글이 단편의 1, 2, 3, 4, ... 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고,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본질을 잡아내기가 살짝 힘들었다. 굉장한 글쟁이에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읽기 근육이 살짝 필요한 고급 에세이였다. 이번 신작 에세이는 페미니즘만 다루지 않고, 그가 여성으로써 겪어 온 삶의 전반적인 경험과 통찰을 다룬다. 그와 나의 세대 차이와 문화적 간극은 상당하지만, 같은 여성으로써 공통의 경험이 다소 있어서 많은 부분을 메모하며 읽었다. 가장 공감이 갔던 내용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 구한 월세방에서의 세월과 경험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방에서 친구로부터받은 오래된 책상에서 수많은 글을 쓰며 자신을 성장시킨 내용들이었다.
그 곳이 아직 내 집이었을 때, 그 집 속에서 다른 방이나 다른 문을 발견하는 꿈도 여러번 꿨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집이 나였고 내가 그 집이었으니, 그때 발견한 것은 당연히 내 안의 다른 나였다. 꿈에서 어린 시절 집을 볼 때는 늘 내가 그곳에 갇힌 상황이었던 데 비해, 이 집은 나를 가두기는커녕 내게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주었다. 꿈에서 집은 더 컸고, 방이 더 많았고, 현실에는 없는 벽난로며 숨은 공간이며 아름다움이 있었다. 한번은 뒷문을 열었더니 현실에 있던 칙칙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환히 빛나는 들판이 펼쳐졌다.
광대한 하늘, 바다, 먼 수평선, 창공을 맴도는 야생 새들에 견주면 내 근심과 고뇌가 하찮아진다는 점에서, 출렁이는 바다와 긴 백사장은 또 다른 집이자 피난처였다. 그 작은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 집은 내 피난처였고, 인큐베이터였고, 껍데기였고, 닻이었고, 출발대였으며, 낯선 이가 준 선물이었다.
독립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공감하지 못했을 공통의 경험이다. 리베카 솔닛은 그집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고, 나는 현재 집에서 산 시간이 만 2년이 채되지 않는다. 그래도 독립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간 그 경험을 읽으며 앞으로의 내 독립생활에 대한 기대에 더욱 부풀고 충실히 살고 싶어졌다. 그리고 리베카 솔닛이 그동안의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 동료들, 하위 문화 동료들과의 경험을 통해 더 다양한 층위와 세상을 보게 해주었고, 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언어를 더 견고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구석진 곳,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 내가 겪어 보지 않은 차별도 들여다보아야 내가 겪은 불합리와 차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