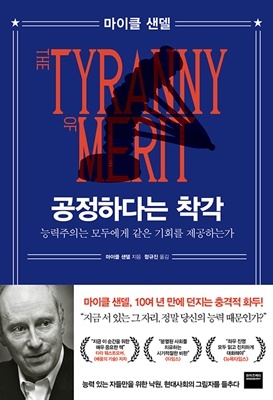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에서부터 미국 초기 공화정까지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공공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저런 차이가 있어도 능력뿐만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다. 공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치에 시민적 미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 판단 사이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는 경제 영역에서 '공동선이란 GDP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해 버렸으며, 정부 영역에서 능력이란 곧 기술관료적 전문성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로서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뒤틀어놓았다. 학력이 있는 사람들의 명예는 보상받는 돈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대신에, 대부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명예는 반대로 추락하게 되었고 이윽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노동자들의 사회적 기여가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내던져졌다.
또한 이러한 정치경제적 관점 이전에, 기술관료적 정치인들이 말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기본 사실에 전원 동의해야 하며, 그 이후에 우리는 각자의 의견과 신념을 가지고 토론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펙트(사실) 제시는, 시민들의 관점과 가치판단을 미리 정해버리는 기만에 해당한다. 정치 토론은 종종 의제와 연관된 사실을 어떻게 잡아내고 정의할지에 대해 벌어진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프레임화하는 데 일단 성공하면, 그는 장기적으로 그 논쟁에서 이긴 셈이다. 모이니한의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의견은 우리의 인식을 사로잡는다. 의견이란 것은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정립된 뒤에 비로소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팩트'만 말하는 기술관료적 입장은 겉보기로는 잡음의 여지가 없는 가치중립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매력이자 단점이 된다. 기술관료들이 말하는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한 규제 틀' 같은 이야기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질문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화석연료 산업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민주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연을 도구화하도록 부추긴 소비주의적 생활 태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쓰고 버리는 문화"라고 부른 그런 태도를 재고해야 할 것인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며, '과학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경제를 대규모로 뜯어고치며 특정인들의 잇속을 채우려 하는 게 아닌지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는 전문가들이 대답해야 할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위한, 민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권력, 도덕, 권위, 신뢰에 대한 질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