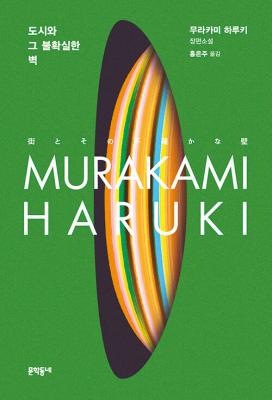이 소설은 한 소년의 첫사랑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17살 소년이 16살 소녀를 사랑하는 감정이 물가를 건너는 추억을 통해 모래알, 물결 등 그 당시 자연적 감성에 녹아내림으로써 독자에게 다가간다.
현실과 비현실의 두 가지 공간이 서로 맞물려 어디가 진짜 세계인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를테면 주인공의 과거를 통해 청소년기의 현실이 진짜인지 아니면 30년이 흐른 중년의 주인공이 도착한 세계가 진짜인지 서로가 헷갈리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 사이의 커다랗고 높은 벽이 존재하며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분리하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눈에 상처를 새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적인 공간이다. 또한 그곳은 시계탑에 시간을 가리키는 시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딘가 모를 차갑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곳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곳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도서관 사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또 다른 존재 그림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 세계가 진짜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세계에서 탈출하게 된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공간 중 어느 한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공간으로서 무한한 삶과 매번 똑같은 일상, 너무나도 지속적이며 이미 이상향에 도달한 듯한 목표가 없는 모습이었다.
반면, 또 다른 세상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도서관장, 그의 부인과 아들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대하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삶에 더욱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꿈에 이르는 삶을 응원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상실이라는 개념에 대해 독자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우리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난 수많은 존재들이며 각기 다르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눈을 감고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은 존재들과 이미 떠나간 존재들에 대한 그리움과 못다 한 아쉬움, 추억 등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실감의 깊이에 대해 또 한 번 독자 들의 귀에 종을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