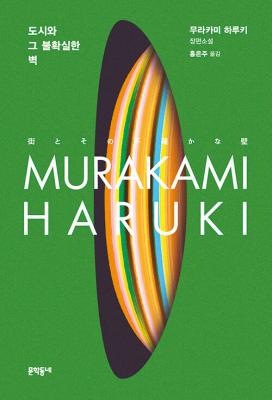내가 처음 읽은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해변의 카프카이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즈음이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이다. 책의 내용이 이제는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오래된 도서관에서 홀로 책을 읽던 외로운 주인공의 모습과 신비롭고 몽환적이었던 여러 장면들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 이후로도 노르웨이의 숲, 1Q84 그리고 최근에는 일인칭단수라는 단편까지 오랫동안 하루키의 책을 읽어오고 있다. 작가의 책에서 느껴지는 신비롭고 쓸쓸한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나온 하루키의 장편 소설이 반갑고 설렜다. 표지를 보자마자 얼른 읽고 싶다는 생각에 조급했다. 그래서 주말이 되자마자 카페에 가서 이번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읽기가 힘들었다. 잘 읽히지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하루 이틀 꾸역꾸역 읽다가, 결국 책을 덮고 말았다.
책은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어릴 적 소녀를 만났고, 그 소녀는 주인공에게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는 갑자기 떠나버린다. 주인공은 작가가 되지 못하고 출판업계에서 일한다. 45세가 될 무렵 주인공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체는 도시로, 그림자는 시골의 도서관장이 된다. 도시 속에서 주인공은 꿈 읽기를 하지만 주인공보다 훨씬 꿈 읽기에 재능 있는 소년을 만나 자신의 직책을 물려주고 현실로 돌아와 그림자와 하나가 된다.
주인공과 신비로운 여자, 꿈을 읽는 자, 높은 벽으로 둘러쌓인 신비로운 도시, 도서관 등 여러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옛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서 이미 보았던 것 같았다.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느낌이 지루했다.
무엇이 변한걸까 생각했다. 책은 변하지 않았다. 작가도 변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변해있었다. 나는 하루키가 묘사하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줄거리에 끌림을 느끼지 못했다. 신비로운 주인공, 신비로운 관계들, 신비로운 사건들. 나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좋아하고 아껴왔던 그 느낌을, 언제인지는 모르겠는 순간에 흥미를 놓치고 말았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은걸까. 아님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현실적이 되어버린 걸까. 삶에서도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들을 찾기 힘들어진 것처럼, 나는 책에서 더이상 그런 것들을 찾지 않게 된걸까. 책의 줄거리보다 변해버린 내 모습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하루키 책을 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슬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