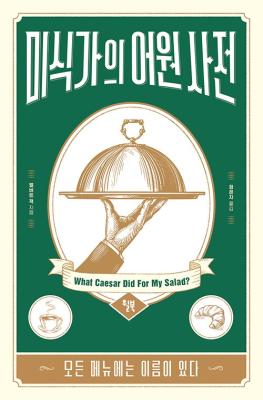<미식가의 어원 사전>에는 다양한 음식의 예시가 나와 있다. 음식이 아니라 일반 단어 역시 음식에서 그 유래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가령 음식이 고유한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부르게 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다.
또한, 모든 음식에는 매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있다고 한다. 저자는 음식의 이름이 탄생한 진귀한 사연을 찾기 위해 세계 역사와 문화를 파고들어간다. 그렇게 탄생한 도서 '미식가의 어원사전'에는 고대 인류의 지혜가 담긴 요리부터 중세의 음식행상을 모방해 세계 정복에 성공한 패스트푸드까지 음식의 기원과 그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낸다.
책은 1장 아침식사로 시작해 저녁 식사의 마지막 코스인 17장 치즈로 구성돼 있다. 식전주처럼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도 독립적인 챕터로 다뤄 좀더 섬세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저자는 음식의 어원을 탐구하는 여정은 언어와 역사, 문화의 전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설명한다. 미식가는 물론이고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저자와 함께 미식기행을 떠나보는 건, 일상에서 쉽게 즐겼던 요리도 조금은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다만, 이 책의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저자가 영국인이기에 책에서 소개된 대부분이 영국 음식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내게는 생소한 음식이 좀 있었고(어쩌면 대부분의 음식들이), 모르는 음식이 많아 그 어원이나 관련된 역사를 보기가 지루했다. 예를 들어 "발티"라는 음식을 소개했는데 음식 자체를 전혀 모르는데 그 음식의 역사이야기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또한, '데빌드 키드니와 통조림 햄' 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데빌드 키드니와 통조림 햄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는 문장인지, 데빌드가 음식에 쓰이는 게 의아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또 '커피'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왜 훈제 청어가 아침 식사에서 키퍼로 바뀌는지 내 입장에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이 단지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아님 글쓰기 방식 때문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다. 비시수아즈, 부야베스, 스모가스보드, 후무스 같은 요리는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 그 때마다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들어본 적 없는 음식의 경우, 중간 중간 건너 뛰었다.
그래도 피자, 파스타, 진토닉 등 대중적인 서양음식들도 많이 나와서 읽을 만했고 호기심을 자극했다. 생각해보면, 밥을 먹으며 자주 접하는 음식마저도 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태반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음식의 이름에도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