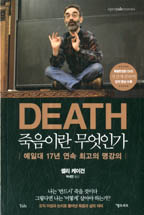이 책은 샐리 케이건 교수가 에일대에서 진행한 교양철학강좌 'death'를 재구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 이 책은 죽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다룬다. 가령,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영혼, 죽음의 본질, 영생의 가능성 등을 다룬다. 영혼의 존재를 옹호하는 것은 보통 이원론자들이다. 하지만 물리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원론자들의 주장은 그리 설득력있지 못하다. 비물질적인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죽음은 생존의 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닌 생존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인격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죽음 자체도 정의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철학자의 시선에서 분명한 것은,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다가 파괴되는 것이 죽음에 관한 전부라는 것이다.
이후에는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 가령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라면 죽음은 나쁜 것일까?'와 같은 주제이다. 반대로 영생은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다. 이 역시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죽음이 나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죽고 나서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영생이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최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이 오래 사는 삶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자살은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삶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이 도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상을 살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는 흔치 않다. 이 책은 그런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책이다. 동시에, 저자가 결국 죽음을 통해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도 인상깊었다. 이 책을 읽으며, 죽음을 단순히 두렵거나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통해 지금 삶의 의미를 고민해보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