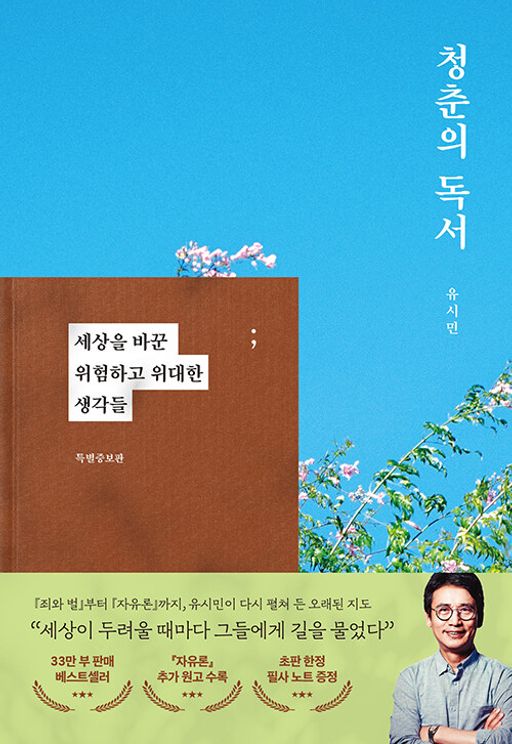작가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가, 정치인, 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인간 유시민의 생각과 고민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읽는 것도 의미 있고,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안내에 따라 고전의 세계를 경험해보게 되는 책이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악한 수단을 사용한 데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게 삶의 이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은, 악한 수단으로 선한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나는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악한 수단으로는 선한 목적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고 믿는다.
_「1장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다시 『인구론』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우리 모두는 갖가지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니고 산다.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통념이 논리적·경험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시험하고 검토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념과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맬서스와 얼마나 다른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 신념을 받치고 있는 수많은 통념들 가운데 그릇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을 것인가?
_「4장 불평등은 불가피한 자연법칙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할까? 나도 이것을 읽으면 가슴 밑바닥에서 잔잔한 파도가 밀려드는 느낌을 받는다. 어쩌면 일제강점기 때 누군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사는 게 노엽고 슬펐던 조선 민중의 마음을 울렸는지도 모른다. 푸시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든, 누군가의 시가 다른 시대 다른 민족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차르의 학정과 일제의 압제는 똑같이 ‘힘든 날’이며 ‘슬픈 현재’였다. 우리의 선조들은 푸시킨의 시에서 큰 위안과 격려를 받았던 듯하다.
_「5장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나는 젊은 시절에 다윈을 읽지 않았다. 『인구론』을 읽지 않고도 인구법칙을 안다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의 기원』을 읽지 않았지만 진화론을 안다고 생각했다. 다윈은 토머스 맬서스나 허버트 스펜서처럼 ‘불쾌한 이름’들과 함께 등장하곤 했기 때문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다. 나는 빈곤을 정당화하고 빈민 구제를 비난한 맬서스를 미워했고,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강자를 편든 스펜서를 싫어했다. 그들이 펼친 ‘사회진화론’ 또는 ‘사회다윈주의’가 부자와 강자를 예찬하고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천박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다. 진화론이 올바른 생물학 이론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윈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다.
_「10장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나는 외롭게 살다 간 베블런이 안쓰럽다. 자신을 회고하거나 추모하는 글을 쓰지 말라고 유언했지만, 내게는 그 유언을 지킬 의무가 없다. “베블런 박사, 당신 고향 별에서는 외롭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젠 다 지나간 일이지만, 호모사피엔스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괜찮은 종(種)이랍니다.”
_「11장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