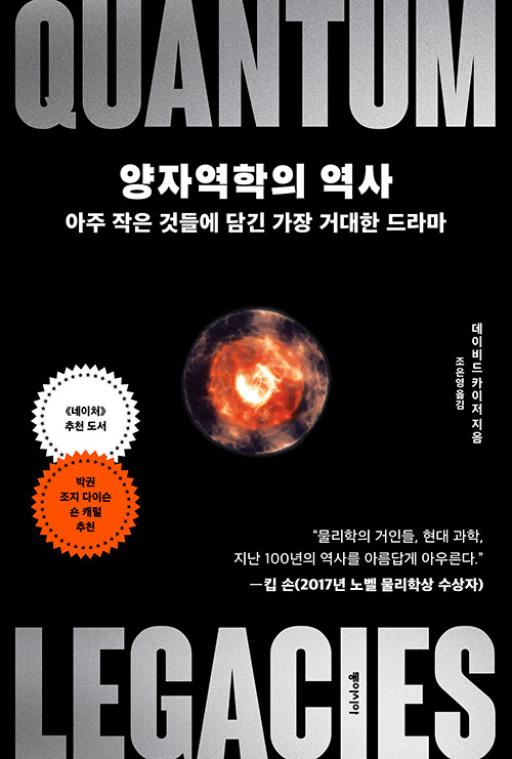데이비드 카이저의 『양자역학의 역사』는 물리학의 난해한 개념과 과학사, 그리고 문화사가 절묘하게 엮인 독특한 책이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과학의 세계에, 1970년대 미국 히피 문화라는 뜬금없어 보이는 요소가 얽히며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를 형성한다.
이 책은 냉전기 이후 미국 과학계, 특히 물리학계의 변화와 그 흐름 속에서 주류에서 벗어난 연구자들이 어떻게 양자역학의 본질적인 문제, 특히 양자 얽힘, 비국소성, 벨의 정리 등에 다시 불을 붙였는지를 추적한다. 주인공 격인 ‘펀(Fundamental Fysiks Group)’은 당시 주류 학계로부터 외면받던 젊은 과학자들로, 스탠포드와 버클리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사유를 펼쳤고, 때로는 명상과 LSD, 심령 현상에도 관심을 두며 ‘양자역학의 의미’를 고민했다.
카이저는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주변부 운동이 아니라, 오늘날 정보이론과 양자컴퓨팅, 양자암호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진 중요한 기반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무용한 철학’처럼 여겨지던 주제가 미래 기술의 초석이 되었음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과학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점이다. 대중적인 문체로 복잡한 과학사와 개념을 풀어내되, 깊이를 잃지 않는다. 동시에 과학 지식이 특정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때로는 억압되거나 꽃피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물리학의 개념 설명이 비교적 쉽게 풀렸다고는 하나, 양자역학과 관련된 철학적·수학적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일부 장에서 다소 진입 장벽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과학과 대중문화의 결합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에겐 다소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의 역사』는 과학사를 단순히 ‘정답의 진화사’가 아니라, 사유의 자유로움과 문화적 다양성이 과학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보기 드문 책이다. 과학, 철학, 문화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물리학적 개념들이 어떤 ‘비정통적 사유’로부터 촉발되었는지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