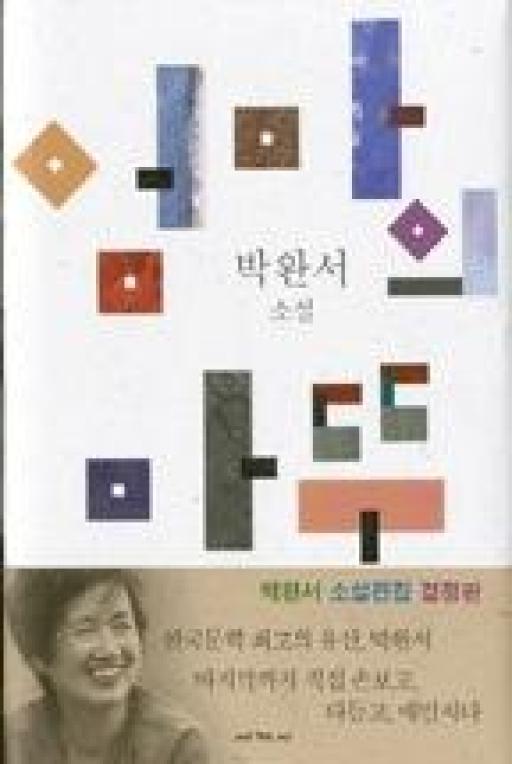요즘 들어 부쩍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부모님 챙기다 보면 문득 멈춰 서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싶은 순간이 온다. 그런 내게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은 가슴 깊은 곳을 묵직하게 두드리는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면서 한없이 단단하고, 동시에 너무나 연약했던 ‘엄마’라는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의 말뚝』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다. 특히 가난한 시절, 전쟁통 속에서도 자식들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고집, 희생, 그리고 체념 속의 사랑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서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삶에 박아둔 ‘말뚝’이란 표현이 너무 강렬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도 각자 그런 말뚝을 박으며 버텨온 게 아닐까 싶었다.
읽으면서 자꾸 우리 어머니가 떠올랐다. 나 어릴 때, 형편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새 운동화 하나 사주려고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시던 모습.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앉아 계시던 모습.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다. 부모가 된다는 건, 어쩌면 자식에게 평생 들키지 않을 마음의 말뚝 하나씩 박아나가는 일이 아닐까.
박완서 작가는 특별한 문장 없이도 사람 마음을 툭 건드린다. 담담한 어투로 써 내려간 이야기들이 어느새 내 기억과 겹치고, 내가 잊고 있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리움, 죄책감, 고마움… 평소엔 꺼내보지도 못하던 감정들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괜히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드렸다. 별 얘기 안 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하더라.
이제 나도 어느덧 중년이다. 나이 들수록 점점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싶어지는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말뚝이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선택과 인내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뚝이 되리라 믿는다.
『엄마의 말뚝』은 그저 ‘엄마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기록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번쯤 멈춰 서고 싶은 사람, 잊고 있던 마음을 되새기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은 꼭 읽어볼 만하다. 나는 늦었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 책을 만났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 말뚝 하나를 더 단단히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