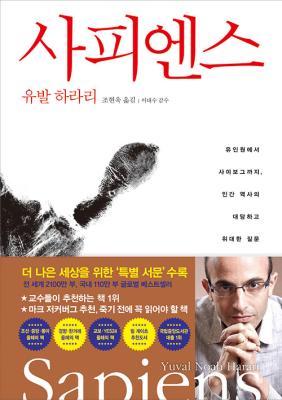인류 중 누군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다. 나 역시 그런 부류 중 하나이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자신하는 인간들이 리더를 자처하는 반면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당연스럽게 누군가의 지배 아래 놓이는 삶을 살아간다. 어쩌면 태생부터 정해지는 인간 각자 마다의 다른 유전적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어느 덧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문명이 발달하고, 별을 관측하고, 예술을 창조하며, 도덕과 법을 논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 역시 그러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그런 믿음에 균열을 내는 책이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균열 속에서 나는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피엔스』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으로서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우연과 허구에 의존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특히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라는 세 개의 커다란 전환점을 통해 인간은 비범한 도약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진보의 서사가 아니다. 하라리는 인간이 허구를 믿는 능력을 통해 협력하고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종과 자연, 심지어는 같은 인간들끼리도 착취와 파괴를 정당화해왔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했다. 인간은 오류 투성의 존재이고,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꿈꿔왔다. 불확실한 진보 속에서도 인류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식을 계승하며, 고통과 불의에 저항해왔다. 사피엔스는 ‘완벽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다.
또한 『사피엔스』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연 정복이나 기술 진보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라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진짜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은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물질적 성취가 아닌, 의미와 윤리를 추구하는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문명은 수많은 생명 위에 세워졌고, 이제는 그 책임을 자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위대함이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성’과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사피엔스』는 단순히 인류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다.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찬란함 속의 어두움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