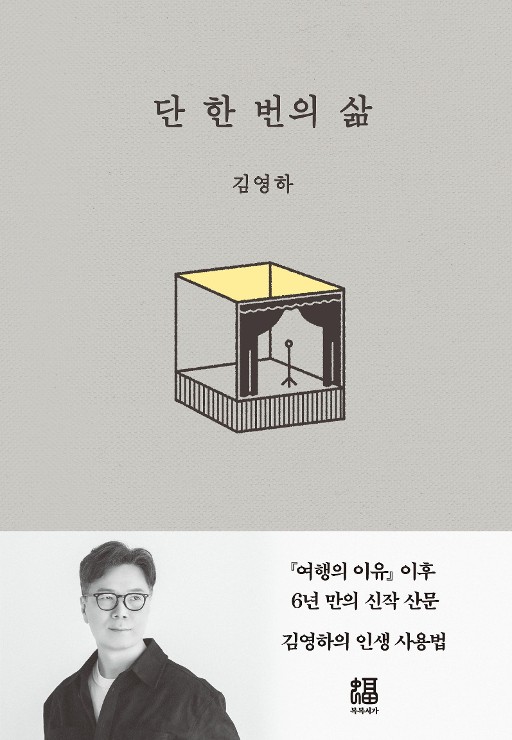나는 김영하 작가의 글을 좋아한다. 무덤덤한 말투로 전하는 세상에 대한 그 만의 통찰은 세상을 단조롭게 바라보던 나에게 사색의 즐거움을 준다.
"단 한 번의 삶"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오히려 무슨 내용의 책일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펼치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내가 왜 그의 글을 좋아했는지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단 한 번의 삶' 이라는 말과 '인생은 일회용'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지만 너무나 다른 느낌을 준다. '단 한 번'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일회용'이라는 말에 지나간 삶을 후회하며 남은 삶을 혹시나 허비하진 않을지 걱정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돌아봄의 방향을 정해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풍경을 펼쳐 보인다.
시작이 정해지지 않았고, 끝도 불확실한 이 일회성의 삶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작가는 이 물음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고민을 반복하고 사유하도록 유도한다.
이 책 속에는 영화 이야기와 책 이야기, 인생의 갈래 길에서 마주했던 다양한 에피소드가 뒤섞여 있다. 작가는 삶을 형성하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나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연속임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대학 신입생 시절 우연히 가입하게 된 동아리,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 혹은 아버지와의 서먹한 관계에서 비롯된 글쓰기의 집착까지. 이 모든 일상의 흔적이 결국 지금의 김영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특별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읽힌다.
이 책은 무언가를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을 건다. 확실한 게 거의 없어서 괴롭고, 넓어지는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작가는 확신은 없을 수 있어도, '내가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지'에 대한 감각만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유일한 감각일지 모른다.
이 책을 덮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것이다. 살아 있는 자로서, 이 삶이 유일한 공연임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진다. 그리하여 삶이,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