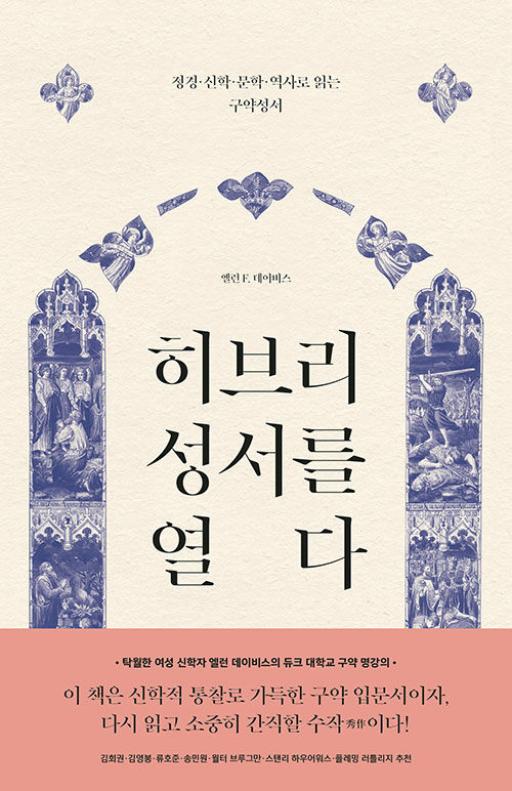히브리 성서를 열다는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성경, 그중에서도 히브리 성서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책이다. 기존에는 성경을 단지 신앙의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접해왔다면, 이 책은 히브리 성서를 하나의 고대 문서이자 문학 작품, 그리고 역사적 산물로 읽는 눈을 열어준다. 성경을 신앙의 필터 없이 그대로, 당대의 삶과 사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느꼈다.
책은 각 성서 본문의 배경, 작성 시기, 저자층, 그리고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차분하게 설명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저자가 히브리 성서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로 보기보다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과 투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담긴 살아 있는 기록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성서를 정답의 책이 아니라 질문의 책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욥기의 고통과 의로움에 대한 물음, 전도서의 허무함과 지혜에 대한 성찰, 창세기의 인간과 죄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단순한 교훈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연결되는 보편적 삶의 고민으로 읽혔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적인 이야기였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다.
무엇보다 저자의 글은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하다. 학문적 깊이를 지니면서도, 성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문장이 돋보였다. 덕분에 히브리 성서를 전혀 모르는 나 같은 독자도 부담 없이 읽어나갈 수 있었다. 때론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더 천천히, 곱씹어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좋았다.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성서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무작정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고민,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읽어내려 한다. 이런 시각은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다.
종교적인 독자뿐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인간적이고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히브리 성서를 한 권씩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인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귀한 길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