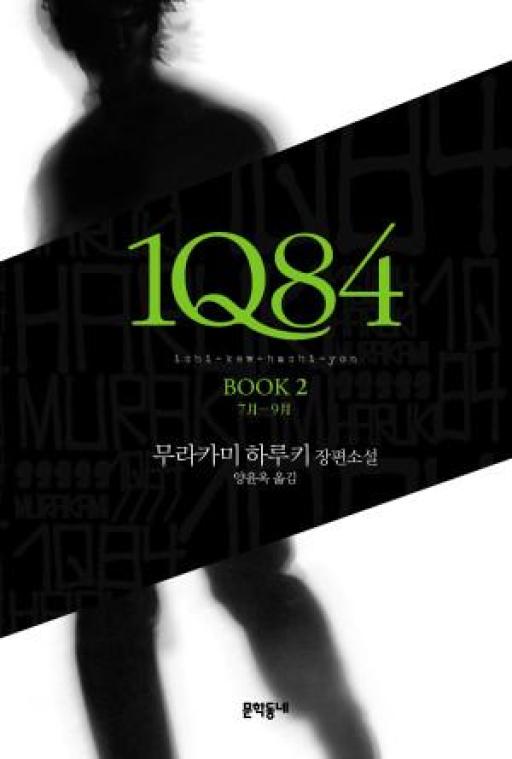1q84 1을 읽고 2권도 신청하게 되었는데 2권도 전편과 마찬가지로 두 주인공의 에피소드가 한장 한장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흥미로울 수 밖에 없었다. 1권을 읽을땐 등장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없고 교차되며 펼쳐지는 에피소드가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 주인공 사이에서 피어나는 애절함과 두근거리는 서스펜스까지 더해졌으니 결국 이런 기상천외한 속도로 주파했다 2권을 읽는 내내 덴고와 아오마메가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가 너무 궁금했다.
1권에서는 적확하다가 유달리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었다는 2권에서는 닿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국어사전에 가닿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가 닿다만 여러 차례 등장하였다. 가닿다는 시선이 가닿다, 눈길이 가닿다와 같은 조금은 관념적인 개념에 적용되는 표현인데 가 닿다는 실체가 있는 두 대상이 물리적인 접촉에까지 이르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 번역 과정에서 고민거리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덴고와 아오마메를 생각하면 번역 과정에서 가닿다보다는 가 닿다라는 표현을 택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2000년대의 쓰인 소실이지만 84년도 배경의 소설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비건, 페미니즘 등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2010년대부터 사회적인 문제나 쟁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느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벌써 저 시대때부터 충분히 논의가 있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종이 신문을 읽고, 레코드와 라디오 정시뉴스를 들으며 때론 삐삐를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84년도의 아련한 시대배경을 들여다볼 수 잇었다. 일본은 내가 살아본 곳도 아니고 84년 역시 태어나기도 전인데 시티팝이라고 불려지는 노래를 들을 때 다들 말하는 것처럼 살아보지도 않은 시절에 대한 향수와 비슷한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주인공들과 내적 친밀감을 쌓아오면서, 현실 세계에선 누군가를 이토록 가깝게 아는 게 예사는 아니다 보니 어떤 경우엔 나와 주인공을 동일시하며 동질감을 느낄때도 있었다. 소설속에는 무엇이 등장하던간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마련이다. 3권에서 그것들의 의미가 서서히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