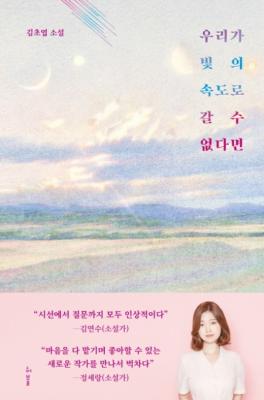소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공간에 대한 상상이 구체화되는 경험을 했다.
텅 비어 있던 상상의 공간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채워졌다.
서울역같이 적막하고 꽉 가로막힌 역사를 생각했다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로 되었단 말에 광활한 우주가 내려다보이고,
발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공간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상상이 채워지는 경험은 공간에서만 느낀 게 아니었다.
사실 처음에 등장한 노인도 아무런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남성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녀’라고 해서 흠칫, 정거장이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을 상상하며 읽었는데 ‘우주선’이라고 하길래 흠칫했다.
소설 단 한 쪽에 몇 번의 흠칫을 거듭했는지 모른다.
안나의 혁신적인 연구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삶은 공존할 수 없었다. 참 각박하고도 잔인한 현실이 그려졌다.
헤어져도 같은 하늘에 있지 않고, 같은 시간을 살지 않으며 빛의 속도로 살 수 없고 갈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었다.
‘그깟 연구 발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날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분명히 기회가 있었던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책했을까.
안타까운 이별 속에서 빛의 속도를 동경하다가 우주가 허락하는 또 다른 통로의 기적을 바랐을 안나가 그려진다.
벌레 먹은 사과 같다면서 새로운 웜홀은 생길 수 없었나 보다.
남자가 죽어가는 로봇을 고치려다가 실패한다. 애초에 살아있지 않아서 죽어간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봇은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다. 안나와 비슷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사람이라면 살아내야 할 시간을 멈춘 채, 안나는 서서히 끝을 짐작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폐허가 된 우주정거장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결국에는 꺼져버린 로봇.
자신과 가족들을 이별하게 만든 냉동 수면 기계에 의존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안나가 겹쳐 보였다.
살아 있지도 않고, 죽어 있지도 않은 상태라는 게 야속하게도 참 닮아 있었다.
결국, 안나는 슬렌포니아로 떠났다. 안나가 꼭 도달하길 바란다.
그곳에서 안나의 가족들이 일궈 놓은 또 다른 세상과 하늘과 공기를 마주하길 바란다.
빛의 속도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들 더라도 꼭 마주하길 바란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안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꾸어 놓았을 다음 세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연결을 원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곤 하니까.
안나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마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