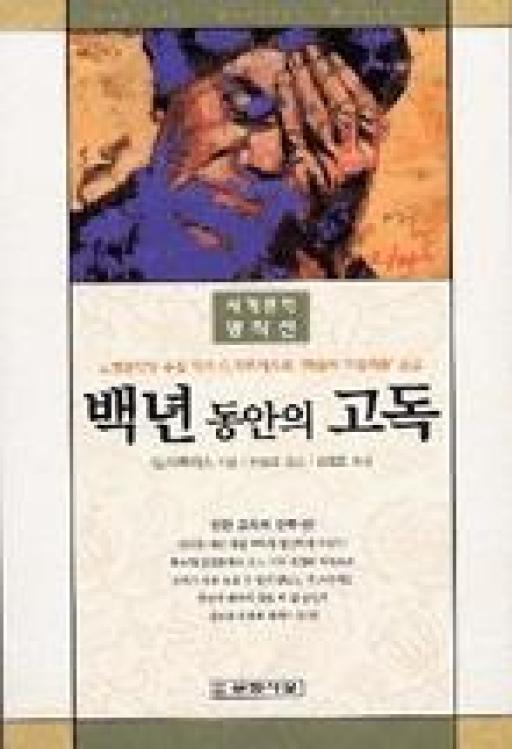보면 여태까지 읽어왔던 소설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소설은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때 소설을 소설의 색을 잃고 그저 고발하고 보도하는 열할 밖에 하지 못하는 그리고 문학다운 맛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나친 초현실주의 적인 작품은 자칫 그저 소설로만 남기 쉽다. 흥미위주의 소설로 말이다. 어느 정도 사회를 투영하지 못한 소설들은 우리 사회와 분리된 한 부분으로 픽션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백 년 동안의 고독’은 작가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상력과 중남미 대륙의 역사를 엮어내며 사회현실과 초현실주의를 적절히 가미하여 써 내렷다. 이러한 부분이 이 소설이 다른 소설과 구분되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내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백 년 동안의 고독’이 이제까지 읽어왔던 소설들과는 다른 소설이었다는 점이다. 한 일가의 일대기를 그려낸 소설이자 개개인들의 고독을 그려낸 작품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큰 고독을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점이 색달랐다. 두 번째로 읽게 된다면 어쩌면 조금 더 부엔디아 가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한 양피지에 예견되었던 그들의 몰락하는 한 세기를 말이다.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나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를 읽었을 때 나는 그 도저한 리얼리즘에 탄복했고 ‘나도 한 번 열심히 써봐야지’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년 동안의 고독> (안정효 역, 문학사상사)의 독후감은 ‘아, 어떤 작가는 하늘이 내는구나’였다. 마르케스는 ‘카피 불가능’의 작가다. 소설의 하늘에 달처럼 걸려 있는 이런 작품은 창작을 꿈꾸는 이들을 낙담케 하지만 동시에 쉬이 열정을 접지 못하게 만든다.
<백년 동안의 고독>은 여러 대에 걸친 한 가문의 흥망성쇠 이야기다. 시·공간을 종횡무진하는 초현실주의 상상력은 다분히 라틴 아메리카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문화적 체험과는 잘 섞이지 않지만 내게 어린 시절에 대한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대목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르슬라라는 여주인이 과자를 구워 팔아서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다. “손님을 맞을 거실과 낮에 시간을 보낼 편안하고 시원한 방과 손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12개 마련한 식당과….” 이 집에는 늘 가족의 두 배쯤 되는 사람들이 북적대며 먹고 자고 한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손자며느리가 안주인이 되자 대문을 닫아걸고 창문은 널빤지로 막았으며 손님들이 끊겨 집안은 일가족의 은밀한 장소가 되었다.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런 풍경은 비단 라틴 아메리카 어느 마을의 일만은 아니다. 현대도시에서 집이란 일가족의 집단합숙소, 피로에 지친 가족들이 모여 쉬는 ‘밤의 공간’이다. 대학생이 되어 서울에 온 뒤로 30년간 동네와 평수와 층수를 바꿨을 뿐 줄곧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내게 우르슬라의 집은 내가 떠나온 고향 강릉의 옛집을 생각나게 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옛집이면서 동시에 우리 세대의 어린 시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