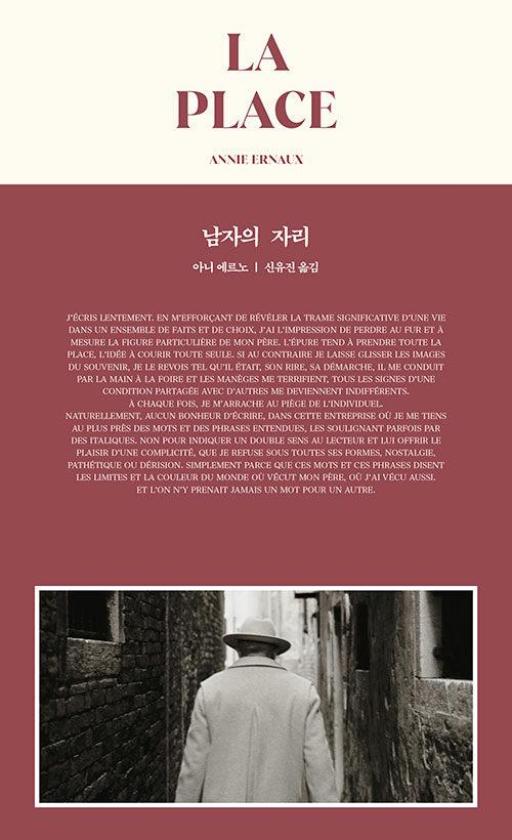아버지의 삶을 회고하며 그의 말과 제스처, 취향,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 자신과 함께 나눴던 한 존재의 모든 객관적인 표적을 사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단어'만을 사용해 옮겨 적은 이 작품은, '어떤 현대 문학과도 닮지 않은 압도적인 걸작'이라는 평과 함께 1984년 르노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학적 요소를 뺀 문학의 가치는 무엇일까? "기억 속 불투명한 혹은 어두컴컴한 곳에 불을 밝히는 것, 나는 그것이 작가, 아니 에르노의 문학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그저 보여주는 것, 화자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것. 이 모든 것은 불투명한 인생을 밝히기 위함이다. 쓰지 않으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어느 불투명한 삶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완벽한 오마주가 어디 있을까? 그녀의 글은 아버지를 향한, 그녀가 내려놓고 떠났던 세상을 향한 오마주다. 그리고 이 오마주는 예술의 편에 서 있지 않다. 삶이 먼저, 문학은 그다음이다. 삶이 문학이 되기 위해 꾸며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 책 <남자의 자리>는 '남자'라는 명사를 빼도 내용을 벗어나지 않지만 남자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해서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의 '자리'가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알려준다. 옮긴이의 말마따나 작품 속 그녀와 그의 이야기에서 우린 왜 우리를 보고 있나. 이 지점이 그간 아니 에르노 작품을 읽으며 가장 절실히 느낀 점이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표적(겉으로 드러난 자취)을 모으겠다는 저자의 글은 꽤 순하다. 독모 참여자 대부분 그간 읽은 책에 비해 가장 읽어내기가 편안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는 그것이 그녀가 17페이지에서 말한 이 글의 서두, '한 존재의 객관적 표적'에 이유를 둔다. 아니 에르노 작품을 계속 읽다 보니 나도 글이 쓰고 싶어졌다. 이런 글 나도 쓸 수 있어! 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옮긴이가 말한 그것, 그녀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로 치환되는 과정을 숱하게 겪었다. 보편적 경험이라 말하고 싶은 잊고 지낸 그 일들, 이를테면 악몽 같은 기억, 난데없이 되살아난 트라우마, 미친 듯 달려들던 주체 못 한 욕망... 그런 내밀한 감정들이 바닥으로 떨어뜨린 콜라의 마개가 따진 것처럼 기둥을 세우며 펑 하고 터져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