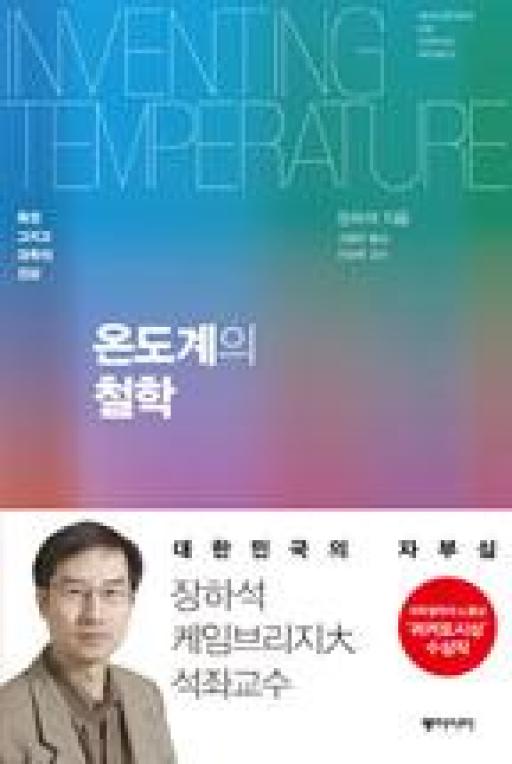"온도계의 철학"을 읽기 전에 장하석 교수가 EBS 강의를 바탕으로 쓴 "과학, 철학을 만나다"를 먼저 읽었다. 내용의 난이도는 "온도계의 철학"이 훨씬 높다. 하지만 두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과 논지는 비슷한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사실 수백년 동안 과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과 실험을 통해서 정립되었다는 점과 과학적 진리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험과 이론 재정립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점이다.
1장은 온도 측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끓는점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었다. 물이 끓어서 증기로 바뀌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논리도 제각각이었고 애써 증명하려고 해봤자 불명확한 전제들에 기대고 있는 허술한 것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표준적인 설명은 한 지점으로 모이게 마련이었는데, 표준은 엄정한 공식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원리’에 바탕을 둔 끊임없는 반복과 자기교정, 즉 ‘인식적 반복’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2장은 합의된 고정점인 어는점과 끓는점 사이를 표준화 된 척도로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정교한 온도계가 없는 상태에서 0도와 100도 사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였다. 온도계의 후보로 수은, 공기, 물 등 다양한 재료가 거론되었지만 애초에 기준으로 쓸 온도계가 없는 상태에서 표준 온도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둥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은 순환의 문제로 귀착되었다. 표준화 된 온도계의 해법은 ‘비교동등성’에 있었다. 최적의 답은 없지만 최대한 상황을 통제해서 비교 실험을 해나가다 보면 한 가지 답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적절한 답은 보여주었다. 가끔은 이론보다 수없이 반복하는 실험이 훨씬 유용한 답을 준다.
3장은 기존 온도계로 도저히 측정이 불가능한 극저, 극고 구간의 온도 측정 방법을 보여 준다.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증명 불가능한 온도를 측정하는데는 여러 연구자들의 상이한 접근방식이 응집된 ‘서로 받쳐주기’ 전략이 도움이 되었다. 이론적 공식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경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셈이다.
4장은 온도에 대한 이론화가 쟁점이 되었다. 온이 없는 상태를 냉으로 볼 것인지, 냉도 부(+)의 부호를 갖는 일종의 성질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이론-조작화-경험의 관계 속에서 상응성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도 역시 해법은 ‘인식적 반복’에 있었다.
아무튼 책이 내용이 어렵기는 했지만 온도라는 친숙한 주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