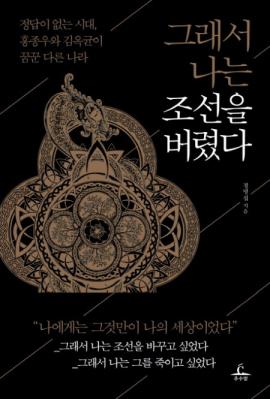김옥균의 죽음은 하나였지만 조선과 일본에서 받은 대접은 극과 극이었다. 김옥균의 시신은 양화진에서 부관참시를 당한다. 잘린 목은 홍종우가 배 안에서 직접 쓴 '대역부도옥균'이라는 깃발과 함께 장대에 매달렸다. 함께 잘린 팔과 다리도 장대에 걸렸다. 사흘 동안 양화진의 모래밭에 있던 시신의 몸통은 강물에 던져졌고, 목과 팔다리는 전국 팔도로 보내졌다. 더불어 십 년 전에 죽은 홍영식의 시신도 다시 꺼내져서 부관참시를 당했다. 조선주재 외국 공사단은 시신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고종은 그의 죽음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푸는 것으로 응수했다. 조선이 김옥균의 기억을 잔인하리만치 철저하게 지우는 동안 일본에서는 계산된 추모 열기가 들끓었다."
그의 무덤이 일본에 두 군데, 그리고 조선에 한 군데 있다는 사실은 삶만큼이나 복잡한 죽음, 그리고 사후 평가와 궤적을 같이한다. 조선에서 김옥균의 무덤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때는 그가 복권된 이후인 1914년이었다. 갑오개혁으로 일본이 후원하는 개화파 정권이 들어서고, 박영효등이 귀국하면서 김옥균은 사면되었다"
김옥균을 암살했다고 홍종우가 수구파일 수 없듯이 개화파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도 아니다. 홍종우가 프랑스행을 감행한 이유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모델이 된 프랑스의 정치와 법률체계를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물론 홍종우는 관련 교육을 받거나 유력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야심을 펼치는 데는 실패했다. 대신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서긔 제국주의가 감춰놓은 야심을 간파했던 것같다.
조선으로 돌아간 홍종우는 한결같이 국왕 중심의 강력한 전제정치체제를 옹호한다. 개화파 대부분이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징적인 존재로 놓고자 했던 것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시각이 김옥균과 홍종우의 시각차이다.
홍종우는 조선을 바꾸고 싶었던 완고한 개화파이자 왕당파로서 프랑스 유학파를 자처했던 그는 왜 대다수의 외국 유학생들처럼 서구의 정치체제를 정답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프랑스 체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홍종우는 제국주의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동시에 오랫동안 왕의 통치를 받아왔던 조선인들에게 낯선 정치체제를 섣불리 접목시켰을 때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옥균과 박영효누 일본에 갔다 와서 정변을 일으킬 정도로 급진적인 개화파가 되었다. 특히 김옥균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쓸 정도로 익히고 양복을 즐겨 입었다. 반면 홍종우는 파리에서도 갓과 도포 차림을 고수했다. 기질 차이인지, 혹은 출신 배경과 성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개화파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러한 거리감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말았다.